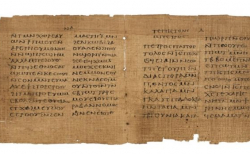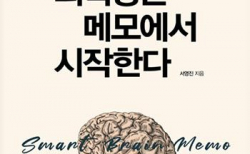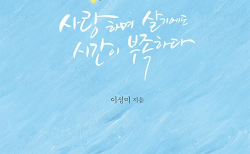알리스터 맥그라스(Alister McGrath)의 <신 없는 사람들(원제 Why God Won’t Go Away?)>은 ‘과학적 무신론자’들에게 전하는 ‘명쾌한 논박’이다. 특히 <만들어진 신>으로 망가진 리처드 도킨스를 필두로 한 ‘새로운 무신론(New Atheism)’ 주창자들에게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운동이 2000년 이후, 정확히는 9·11 테러 이후 갑작스레 등장한 것에 대해 저자는 “사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크게 달라진 바 없으며 여전히 종교가 비합리적이고 위험하다고까지 주장했는데, 그들의 주장이 갑자기 매력적일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럴듯하게 들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사람들은 9·11의 책임을 전가할 어떤 대상을 절실히 찾고 있었고, 잔혹한 만행에 분노하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이슬람의 종교 광신주의’는 ‘종교 광신주의’로, 나중에는 그냥 ‘종교’로 축약돼 버렸다”고 진술한다.
샘 해리스·리처드 도킨스·대니얼 데닛·크리스토퍼 히친스 차례로 논박
먼저 종교를 9·11의 주요 원인으로 이해하면서, <종교의 종말>을 통해 종교에 강력한 독설을 날린 샘 해리스에게 저자는 “종교 재판이나 게슈타포, 탈레반과 KGB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응수한다. 맥그라스는 “종교가 폭력과 증오심을 생산해 내기에, 세상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종교 신봉자들을 살해하는 것이 윤리적이라 주장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며 “샘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재치있게 대답한다.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종교 비판과 무신론에 대한 절대적 옹호로 수사적 세련미가 없는 약점을 극복했다”며 “‘무신론자들의 사도’라 불렸던 문학자 C. 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견줄 만한 대표적인 무신론 책”이라고 평가(?)한다. 맥그라스는 종교로 인해 일어난 폭력과 억압이 실제로 일어난 점에서 그의 비판을 수긍하지만, 그의 ‘밈(meme) 이론’이 이미 생물학적 허구에 불과하다고 널리 인정됐음도 지적하고 있다.
<다윈의 위험한 생각>과 <주문을 깨다> 등을 쓴 미국 철학자 대니얼 데닛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킨스의 밈 이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변론은 별로 없이 그저 신을 고발하는 고소장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쉴새 없이 이어지는 경구와 정교하게 다듬어진 모독을 특징으로 하는 <신은 위대하지 않다>를 쓴 크리스토퍼 히친스에 대해서는 “그의 거들먹거리는 문체에 대해 그의 열광적인 지지자들과 자주 논쟁을 벌였지만, 그들은 히친스가 선언했다면 그걸로 충분하고 어떻게 그가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히친스를 일종의 종교 지도자처럼 여기더라”며 “이런 행동은 신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그의 추종자들이 신을 대신해 신뢰하고 경배할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꼰다.
종교는 여전히 살아 번성… 출애굽기 1장 ‘히브리 민족’처럼
맥그라스는 ‘종교는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비과학적’이라는 이 ‘새롭지 않은’ 새로운 무신론을 하나 하나 논박한 후, 최근의 경향을 전한다. “무신론 블로그에는 지적 우위를 점하려던 무신론 운동의 실패를 개탄하는 날카로운 자아 비판이 자주 등장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사회는 종교의 ‘병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분석에 점차 동의하지 않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종교에 대한 새로운 무신론의 끝없는 분노는, 뜻밖에도 신과 관련된 문제 전체에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저자는 ‘종교의 종말에 대한 식상한 예언과 종교의 해악에 대한 관습적인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마치 출애굽기 1장에서 핍박 속에서도 번성했던 ‘히브리 민족’처럼 종교가 여전히 살아 번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난 2천년 동안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독교의 공통된 이해가, 인간은 신을 그리워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으며, 또 그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그토록 강한 매력을 지닌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간의 이와 같은 경험과 바로 기독교의 진리가 강력하게 공명하기 때문이다.”
이 운동이 2000년 이후, 정확히는 9·11 테러 이후 갑작스레 등장한 것에 대해 저자는 “사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크게 달라진 바 없으며 여전히 종교가 비합리적이고 위험하다고까지 주장했는데, 그들의 주장이 갑자기 매력적일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럴듯하게 들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사람들은 9·11의 책임을 전가할 어떤 대상을 절실히 찾고 있었고, 잔혹한 만행에 분노하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이슬람의 종교 광신주의’는 ‘종교 광신주의’로, 나중에는 그냥 ‘종교’로 축약돼 버렸다”고 진술한다.
샘 해리스·리처드 도킨스·대니얼 데닛·크리스토퍼 히친스 차례로 논박
먼저 종교를 9·11의 주요 원인으로 이해하면서, <종교의 종말>을 통해 종교에 강력한 독설을 날린 샘 해리스에게 저자는 “종교 재판이나 게슈타포, 탈레반과 KGB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응수한다. 맥그라스는 “종교가 폭력과 증오심을 생산해 내기에, 세상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종교 신봉자들을 살해하는 것이 윤리적이라 주장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며 “샘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재치있게 대답한다.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종교 비판과 무신론에 대한 절대적 옹호로 수사적 세련미가 없는 약점을 극복했다”며 “‘무신론자들의 사도’라 불렸던 문학자 C. 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견줄 만한 대표적인 무신론 책”이라고 평가(?)한다. 맥그라스는 종교로 인해 일어난 폭력과 억압이 실제로 일어난 점에서 그의 비판을 수긍하지만, 그의 ‘밈(meme) 이론’이 이미 생물학적 허구에 불과하다고 널리 인정됐음도 지적하고 있다.
<다윈의 위험한 생각>과 <주문을 깨다> 등을 쓴 미국 철학자 대니얼 데닛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킨스의 밈 이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변론은 별로 없이 그저 신을 고발하는 고소장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쉴새 없이 이어지는 경구와 정교하게 다듬어진 모독을 특징으로 하는 <신은 위대하지 않다>를 쓴 크리스토퍼 히친스에 대해서는 “그의 거들먹거리는 문체에 대해 그의 열광적인 지지자들과 자주 논쟁을 벌였지만, 그들은 히친스가 선언했다면 그걸로 충분하고 어떻게 그가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히친스를 일종의 종교 지도자처럼 여기더라”며 “이런 행동은 신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그의 추종자들이 신을 대신해 신뢰하고 경배할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꼰다.
종교는 여전히 살아 번성… 출애굽기 1장 ‘히브리 민족’처럼
맥그라스는 ‘종교는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비과학적’이라는 이 ‘새롭지 않은’ 새로운 무신론을 하나 하나 논박한 후, 최근의 경향을 전한다. “무신론 블로그에는 지적 우위를 점하려던 무신론 운동의 실패를 개탄하는 날카로운 자아 비판이 자주 등장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사회는 종교의 ‘병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분석에 점차 동의하지 않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종교에 대한 새로운 무신론의 끝없는 분노는, 뜻밖에도 신과 관련된 문제 전체에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저자는 ‘종교의 종말에 대한 식상한 예언과 종교의 해악에 대한 관습적인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마치 출애굽기 1장에서 핍박 속에서도 번성했던 ‘히브리 민족’처럼 종교가 여전히 살아 번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난 2천년 동안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독교의 공통된 이해가, 인간은 신을 그리워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으며, 또 그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그토록 강한 매력을 지닌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간의 이와 같은 경험과 바로 기독교의 진리가 강력하게 공명하기 때문이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