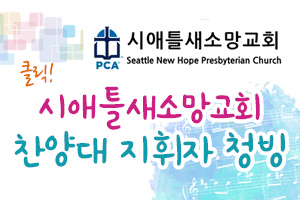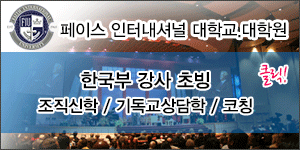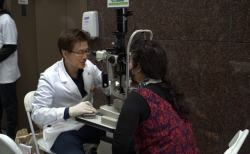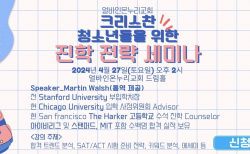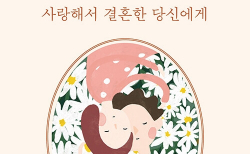2003년 4월 무렵, 나는 'ㄴ'출판사에 편집자로 입사했다. 대학원에 외부강사로 와서 강의한 사장님의 눈에 들어 이른바 '특채'된 것인데, 그게 이유였는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편집부장님의 눈이 곱지 않았다.
편집부로 데리고 간 부장님은 팀원들에게 간단히 내 소개를 하게 한 뒤, 분명 출판계 경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기본적인 설명도 없이 원고를 하나 던져주었다. "최승진 씨, 이 원고 한 번 봐요", "네, 알겠습니다."
출판경력은 고사하고 사회진출 자체가 처음인 마당에 그 말뜻을 알 리도 없고, 주변에 물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성실하게 읽었다'. 나중에 3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으로 출간된 이 원고를 3일 만에 '그냥 읽은' 나는 부장님이 준비한 핵폭탄을 맞고 며칠간 울어야 했다. 진짜 울었다.
야근은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이었고 출판사의 기본 편집방침과 한글 맞춤법을 외우기 위해 무던히 애썼다. 그렇게 6개월을 지내고 나서야 간신히 팀원으로서 인정을 받았다.
출판사에서 2년 반을 일하면서, 나는 책을 만드는 편집자의 고단함을 배웠다. '질리도록'이라는 말을 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글자 한 자 한 자 꼼꼼하게 봐야 하는 교정, 비문(非文)과 군더더기로 중무장한 난문(難文)을 고치는 윤문(潤文) 등은 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비록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부전공으로 택해 공부했지만, 엄연히 내 전공은 물리학이었고 그래서 문자보다 숫자에 대한 이해가 빠른 터였다. 심지어 내가 만드는 대부분의 책이 사회과학서적이거나 인문학 관련 서적이어서 따로 공부를 해야 했다.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책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는가 말이다. 아무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도 난 늘 편집부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배울 게 많은 편집자였다.
그렇게 따라가기에도 벅차기만 했던 편집자의 길에서 벗어나 (사)한국기독교출판협회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후로 내게 책은 전보다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고, 책을 만드는 편집자들은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난 늘 이 마음을 내 아이들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책을 권한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가장 좋은 것이 책이기 때문이다.
첫 원고를 작성하는 저자의 고단함, 그 원고를 수정하는 편집자의 고단함, 그리고 그 책을 독자에게 전하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영업자의 고단함이 더해져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면 지식과 정보가 교통하는 달콤함이 된다. 가끔은 그 고단함에 나의 일상의 고단함이 더해져서 책을 읽다가 잠들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책이 주는 유익이 아닌가 싶다.
나만 그렇게 책을 권하는 것도 아니다. "책을 읽자"는 구호가 무슨 '계몽운동'이나 되는 듯 곳곳에서 들린다. 어린이를 자녀로 둔 부모들의 경우 상당수가 아이들에게 독서를 '강요'하기도 한다. 아마 자신은 책을 잘 읽지 않아도, 자녀들이 인생의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책이 중요한 동반자라는 사실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방법을 좀 다르게 해 보면 어떨까 싶다. 권하지만 말고, '같이 읽자'는 거다. 아이들이 읽는 만화책을 같이 읽고, 학생들이 읽는 소설책을 읽고, 친구가 읽는 교양서적을 같이 읽자. 책을 사주는 데 급급하지 말고, 책을 같이 읽고 대화하는 데 열정을 다해보자는 얘기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아들은 요즘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해 아빠보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겨우내 읽은 만화 이다. 아들 녀석은 그 시리즈를 한 권 한 권 사 모으며 읽었다. 나 역시 아들이 권해준 대로 다 읽었고, 올해 야구장에 10번 이상 함께 가기로 약속해야 했다. 책을 함께 읽으면 함께할 또 다른 즐거움이 생긴다.
/최승진 사무국장(한국기독교출판협회)